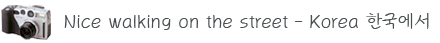
|
||||
|
||||
|
작품/작가론 作家論 -2 생명의 의지와 마음을 그리는 화가, 김창한의 그림 세계 글쓴이: 도병훈 “저 매화에 물을 주거라.” 매화 사랑이 각별해서 수많은 매화시를 남긴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유언으로 전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의 문인 및 예인들은 사군자(四君子)로 꼽힌 매(梅) ∙난(蘭) ∙ 국(菊) ∙ 죽(竹)을 마치 사모하는 연인인양 사랑했다. 군자(君子)란 유교적 이념이 담긴 이상적 인간상으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조를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문인이나 예인들이 사군자를 사랑했던 까닭은 추운 날을 견디고 인적이 드문 자연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나는 고결한 꽃을 피우거나 늘 푸름을 유지하는 식물이어서 시와 그림의 주요 소재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특히 매화는 ‘모진 추위를 겪을수록 더욱 맑은 향기를 발하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절개가 드러난다(梅經寒苦發淸香, 人涉艱難顯其節)’는 시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사군자 중에서도 대나무와 함께 즐겨 그린 소재였다. 주1) 지금도 유서 깊은 고택이나 고찰에 가면 오랜 풍상을 견뎌 온 품격 있는 노거수 매화나무를 볼 수 있다. 이 시대에도 매화가 필 무렵이면 어김없이 양산에 위치한 고찰인 통도사를 찾아가 수령 수 백 년 된 홍매인 ‘자장매(慈藏梅)’를 그리는 ‘매화 작가’가 있다. 바로 화가 김창한이다. 그는 2003년 이후 16년 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자장매 바로 앞에 이젤을 세워 놓고 캔버스에다 유화로 매화를 그려온 작가이다. 이후 작가는 해마다 이른 봄이면 통도사 홍매 현장 사생 뿐만 아니라 낙동강변, 지리산, 선암사, 화엄사 등지에서 매화를 그려왔다. 얼마 전까지 김창한 초대전이 청담동에 위치한 ‘갤러리두’에서 ‘Vital Fantasy 생명의 환희’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그려온 매화 작품들과 함께 잠자리, 과수원, 낙엽, 바다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집약해서 보여주었다. 이처럼 그는 엄청난 열정으로 부단히 그림을 그려 온 다작의 작가로서, 미대 재학 시절부터 줄곧 시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풍부하고도 선명한 색채로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왔다. 대개 그의 화폭은 주요 공간을 배경삼아 대상과 함께 빛 속에서 얻은 순간의 감각을 표현한 강렬한 색채와 생동하는 선적 필 촉으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작가가 추구하는 회화적 표현은 동서 회화가 공존하는 듯한 양면성, 또는 다층성이 두드러진다. 사군자를 주로 그린 옛 문인들은 현장에서 대상을 사생(寫生)하는 대신 대상의 기운이나 운치로서 인간적 정감을 그렸다. 이른바 사의(寫意), 즉 뜻을 옮긴 그림이다. 옛 문인화가들이 그린 사군자 중의 묵매도(墨梅圖) 역시 실물 대상의 형태를 재현한 그림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군자를 그린 문인(文人)들은 시인, 묵객(墨客)은 물론 계층으로는 사대부이면서 대개 삶과 자연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사색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성리학 용어로는 ‘관물찰리(觀物察理)’ 라 하는 바, ‘관찰’과 ‘물리’로 읽을 수 있는 이 개념은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그 이치를 꿰뚫고자 한 학문의 핵심을 드러낸다. 주2) 그러나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의 진경산수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전통화가들은 실경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전통회화를 그리는 과정은 실물과 닮아야 하고, 닮음으로써 그 대상의 기호가 되어야 하는 ‘유사(類似)의 원리’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비슷하되 차이가 생겨나는 ‘상사(相似)’의 놀이로 볼 수 있다. ‘묵매’와 ‘묵죽’, 그리고 ‘묵란’이라는 말을 쓰는 데서 알 수 있듯, 그것은 엄연히 실물과 다른 그야말로 먹으로 그린 매화요, 대나무요, 난초이다. 원본이 있으되, 원본이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화가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 결이 고운 명주나 한지의 재질과 먹의 농담과 붓놀림에 따라서는 섬세한 감수성이나 굳센 기질을 드러내는 수묵화가 그려졌다. 그래서 탁월한 전통 수묵화가 보여주는 묵해(墨海)는 넓고 깊으며, 묵운(墨韻)의 변화는 무한감을 준다.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7)의 ‘묵매(墨梅)’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백매(白梅)’가 다른 이유는 그들의 오감과 필법과 묵법의 구사력, 그림의 바탕 재질 등과 같은 변인 때문이다. 옛 전통회화 중에서도 먹물과 붓질의 미묘한 변주라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세계로 형성되는 사의적 수묵화는 거시 세계인 대자연, 또는 우주를 관통하는 키워드와 다르지 않았으니, 그것은 ‘기(氣)’와 ‘운(韻)’, 즉 기의 리듬이었다. 옛 문인화가들은 늘 변화하는 자연, 즉 ‘물경(物境)’을 ‘정경(情景)’으로 교융(交融)했으며, 이런 문맥에서 산수화와 함께 사의적 수묵화의 주요 화목인 사군자화는 문인들의 감성적 소통 방식이었다. 노장(老莊)과 선종(禪宗)의 언어를 빌리면, 산수화이든 매화도이든, 허(虛)와 실(實)의 변주로써 ‘평담(平淡)’과 ‘천진(天眞)’에 이르는 매개체였던 것이다.(*이와 달리 사군자화가 맥 빠진 동어반복으로 상투적인 필묵 유희로 전락했을 때, 그것은 그저 서투른 속된 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의 옛 그림도 예술적 성취 면에서는 현대미술과 마찬가지로 그 ‘명’과 ‘암’이 뚜렷하므로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김창한 전에서 순환하는 사계를 볼 수 있듯, 그의 그림 역시 사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고 대상을 빌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전통회화와 일맥상통하나, 현실에 대한 직시와 함께 능동적 의지를 담고자 한다. 자연은 단순히 심미적 감상에 머무는 존재로 파악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담는 매개체로 보고자하며, 사람들의 모습에선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꿈꾼다. - 작가 노트 중에서 이러한 자신의 의지로 작가는 겨울 잠자리를 상상해서 그리거나 매화와 같은 봄꽃으로 자신의 마음, 즉 소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가는 기나긴 겨울 동안 누구나 바라는 봄을 무수한 꽃봉오리에서 막 개화하기 시작하는, 생명력 넘치는 매화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 서두에서 보여준 이황의 특이한(?) 매화 사랑도 결국 봄을 기다리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전시된 작가의 매화 그림 중에는 화면 속 조형적 요소인 난무하는 선적 율동과 원색적 색채가 서로 상충하는 듯한 그림도 보인다. 작가는 그런 점에 개의치 않고 그리는 듯하다. 이번 전시는 그림의 소재도 매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잠자리, 사과 과수원, 바다, 채송화, 달맞이꽃 그림도 볼 수 있다. 소재 불문하고 그의 그림들에서 느껴지는 더욱 독자적인 특성은 표면적인 색채대비보다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가득 차보이며, 이런 점은 서구적 방식의 유화 그림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요소이다. 그 그림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 충실하고자 한 붓질을 드러내면서도 투명에 가까운 맑음을 견지한다. 이처럼 무수히 덧칠했음에도 마치 현대의 투명 수채화 같은 맑은 기운은 이정(李霆,1541~1622)의 풍죽이나 최북(崔北, 1720~? ), 김홍도나 고송유수관(古松流水館) 이인문(李寅文,1745~1821), 북산(北山) 김수철(金秀哲,?~? )등의 그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작가가 르프랑 유화물감을 쓰는 이유도 그림의 투명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주제보다 표현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새로운 표현법을 발견한 모든 탁월한 예술가들의 공통점이다. 내가 애쓴 것과 나의 감각적 표현이 이룰 수 있는 예술적 성취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작가의 길은 늘 절벽 위를 걷는 것에 비유된다. “화가란 제대로 볼 줄 아는 자여야 한다. 미술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 말이 시사하듯, 모든 그림은 보는 것으로 시작되어 보는 것으로 완성된다. 선사시대 이후 그림은 시대와 지역마다 미학적 관점과 상상력을 확장해왔다. 역사에 자취를 남길 정도의 의미 있는 예술이란 무한한 열정으로 가능한 무수한 도전과 실험으로도 극소수의 작가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차원이며, 감응하기 전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그림도, 아니 하나의 점, 단 한 줄의 선도 언제, 누가,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 무한히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전과 다른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그린다는 행위의 반복일 뿐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림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행위인 셈이다 작가는 올 3월부터 23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사직하고 전업 작가로 첫발을 뗐다. 이 전시가 끝나면 작가는 파리, 룩셈부르크, 독일로 건너가 전시와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제 작가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모든 작가는 매순간 죽은 후, 매순간 다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세계도 크게 4시기로 나누는 데서 유추할 수 있듯, 좋은 작가는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한다. 대학 때부터 그의 그림을 지켜보아온 필자로서는 그의 그림이 좀 더 대범해지는 동시에 더욱 세심해짐으로써 더 높은 예술 세계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기의 순간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미지의 세계와 소통하는 길을 열어젖히는 계기만 될 수 있다면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 되듯,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생각하면서, 대상이나 세계를 어떻게 감응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다시 정의하는 실천 행위이기 때문이다. 주1) 매화는 중국 북송(北宋)의 비구니인 화광(華光) 중인(仲仁)이 묵매법을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땅에서는 고려시대 인물인 정지상(鄭知常, ? ~ 1135)이 매화를 처음 그린 것으로 전한다. 남송(南宋)의 조맹견(趙孟堅,1199~1267)은 소나무, 매화, 대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 또는 ‘삼청(三淸)’, 즉 세 가지 맑은 것이라 함으로써 후세에 이를 주제로 한 시와 그림과 함께 ‘맑음’의 정신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중기에 와서는 어몽룡(魚夢龍,1566~1617)의 매화 그림이 대표적이다. 5만 원 권 지폐의 매화가 바로 그의 그림이다. 그의 묵매도에 대해 당시 문인들은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매화의 절개를 강인하고 청신(淸新)하게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어몽룡의 대표작인 이 <월매(月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극적인 대조, 직선과 곡선 이미지를 활용한 시정 넘치는 대비, 하단의 나무 둥치와 수직으로 길게 솟아오른 두 줄기 마들가리의 극적 대비 효과가 탁월하다. 매화와 달을 함께 그린 ‘월매도’는 원래 매초상월(梅梢上月), 즉 ‘나뭇가지 끝의 달’을 그린 것으로, 이는 중국어로 ‘미수상락(眉壽常樂)’, 즉 ‘오래살고 항상 즐겁다’는 사자성어와 동음이어서 그리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심사정의 <묵매도>와 김홍도의 <백매>가 대표적이며, 두 작품 모두 문기와 함께 감성적인 흥취가 두드러진다. 조선 말기는 우봉(又峰) 조희룡(趙熙龍,1789~1866) 의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와 고람(古藍) 전기(田琦, 1825-1854)의 <매화초옥도梅花書屋圖>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오원(吾園) 장승업(張承業,1843~1897)의 병풍을 가득 채운 두 그루 거대한 홍백매화 그림도 특히 두드러진 조형적 요소로 인해 주목할 만하다. 주2)이 말은 송대 문인 소옹(邵雍)의, “무릇 관물(觀物)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理)로 보는 것이다. 천하의 물(物)은 리(理)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성(性)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명(命)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에서 유래 한다. 문 일 이사님께! 불쑥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박균우 고교동창 화가 김창한 입니다. 금번 미술작품 관련자료 요청받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수십년간 작품활동 하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렸기에 어떤 작품을 제안할지 고민 후 총 89작품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최근 15년간 그렸던 캔버스가 큰 것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제2작품집 발간 준비 중이라 자료정리에 도움 되었습니다. 제안한 모든 작품은 현재는 판매/임대가 가능하지만 계속 국내/해외 일정이 있기에 원하시는 작품을 사전예약/계약되지 않으면 일부 작품은 전시출품 혹은 콜렉터/기관으로 판매/임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43, 44 페이지 연꽃 그림 두 점은 이대로 끝낼 수 도 있고, 약간 보완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작품활동이 많은데 10/20~11/30엔 호주에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제 ‘프로필/포트폴리오’는 이사님 이-메일로 지금 보내고, 오늘 출력해서 제1작품집과 그동안 개인전 ‘팜플렛/리플렛’은 등기로 발송하겠습니다. 2010년 발간한 제1작품집 파일도 참고로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데, 웹에 공개한 것이기에 전체내용의 약 70% 입니다. http://www.kch.pe.kr/0-bio/art-book-2010/KCH-sample.pdf 그리고, 20년 이상 운영중인 개인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작품 보실 수 있습니다. www.kch.pe.kr 직접 관리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업데이트가 느린 점 참고바라고, 상단 메인메뉴엔 제 유트브로도 링크가 됩니다. 일반인들과 실시간 소통은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www.facebook.com/changhan.kim.370 인스타그램 kimchanghan2966 끝으로, 지금 준비 중인 ‘제2작품집’은 최근 15년간 작품/활동을 정리중인데 제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리된 것도 함께 보냅니다. 계속 글/자료를 수정/보완해서 내년 3월 중순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출간전이기에 개인적으로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만남으로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이사님 주소 도산대가 생각나서... 가끔씩 강남 청담동 갤러리에서 개인전 할 때 도산대로 주변에서 그림 그렸는데... 당시 그림 첨부합니다...^^ 1 프로필 첨부 2 포트폴리오 첨부 3 제2작품집 파일 첨부 4 도산대로 작품 웰스어드바이저스 (Contents & Operation Division 사업운영본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3길 15, 3F, 06016 문 일 이사님 (Director) 010 2637 4442 02 422 0310 ilmun@wad.co.kr www.wad.co.kr ====================================== 송천스님께! 많이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 개심사 괘불 모사작업은 잘 마무리 되었는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즘도 열심히 그림 그리고 여기저기 전시 준비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2작품집’을 내년 3월 중순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최근 15년간의 작품/활동과 글/자료를 정리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인천시/미술협회 초대 인천아트페어에 초대작가로 저의 작품과 미얀마 7명의 작가들 작품을 준비중인데 얼마전 미얀마에서 도착한 작품 중 코로나 이전에 미얀마 현지에서 그렸던 저의 작품들을 다시 받아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첨부한 작품사진은 미얀마 Bagan바간 도시에서 그린 캔버스 30호 크기 3점이 연결되는 유화그림으로 모두 현지에서 그렸습니다. 그곳은 약2천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사원건물들이 있는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유적지이자 관광지입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건물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벽화의 세월의 깊이에 빠져서 그림을 그렸고 다시 또 그곳에 방문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국 고매의 매력을 그린 것도 20년이 넘은 훌륭한 소재이지만 미얀마에서 느낀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통도사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송천스님 시간이 괜찮을 때 성보박물관에서 만나 뵙고 다음 전시에 관한 의논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내년 3월 제2작품집 발간이후 좀 더 비중있는 큰 전시를 하면서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늘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한 동영상은 지난달 열린 울산 한빛갤러리 초대개인전(울산시/관광문화재단 후원) KBS TV에 실린 모습입니다. |
||||
| Gustbook | ||||
 
 |
![[K]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upload/20220730_183510.jpg)
![[K]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upload/20220730_183506.jpg)
![[K]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upload/20220730_182019.jpg)
![[K]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upload/FB_IMG_1655708798632.jpg)
![[K] -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upload/FB_IMG_1655708792179.jpg)